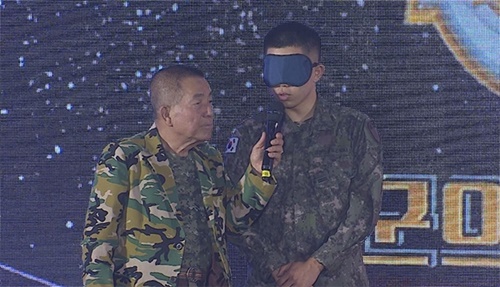1990년대 비디오 대여점, 그때 그 감성 속으로
비디오 대여점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1990년대 비디오 대여점, 그때 그 감성 속으로 빠져볼까요? 1990년대는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감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퇴근길 아버지의 손에 들린 비디오 테이프 한 상자가 온 가족의 저녁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기억, 생생하시지요? 당시 비디오 가게는 단순히 영화를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의 문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사람들의 발걸음, 테이프 하나를 고르느라 진지하게 선반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모습, 심지어 대여료 1,000원을 아끼기 위해 신작 대신 구작 코너를 뒤지던 풍경까지. 모든 것이 낡았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문 열면 퍼지는 플라스틱 냄새와 영상 테이프의 바스락거림
비디오 가게의 문을 열면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VHS 테이프 케이스에서 풍기는 묘한 플라스틱 향기, 형광등 불빛 아래 줄지어 세워진 커다란 테이프 박스들이 어찌나 반짝였는지요. 손에 잡히는 테이프는 마치 마법처럼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고등학생은 ‘타이타닉’이나 ‘라붐’을 찾았고, 초등학생은 ‘쥬라기 공원’이나 ‘쾌걸 조로’를 들고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지요. 그리고 가게 구석 어딘가에는 항상 빨간 커튼으로 가려진 ‘어른들의 구역’이 존재해, 그 앞에서 누가 들어가나 은근슬쩍 지켜보던 장난기 가득한 시선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반납 마감일의 긴장감, 그리고 연체료라는 이름의 공포
그 시절 비디오 대여는 그 자체로 작지만 강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밤 10시까지 반납’이라는 스티커가 테이프 전면에 떡하니 붙어 있었고, 그 마감일을 깜빡하는 순간 ‘연체료’라는 벌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처럼 알림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억 하나에 의지해 시간을 지켜야 했던 아날로그적 긴장감은 오히려 일상의 활력을 주는 장치였습니다. 연체료 500원을 아끼기 위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헐레벌떡 비디오 가게에 들어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짜릿한 감정은 요즘 OTT 플랫폼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성입니다.
직원 추천! 찐 마니아의 큐레이션 서비스
비디오 가게에는 꼭 ‘영화 덕후’ 직원이 한 명쯤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인간 검색기처럼 장르, 감독, 배우, 심지어 OST까지 줄줄이 꿰고 계셨지요. “이거 빌려가셨으면 이 작품도 좋아하실 거예요”라며 영혼을 담아 추천해주시던 그 말투,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정교하고 인간적이었던 그 시절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감성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빌린 ‘쇼생크 탈출’이 인생 영화가 되기도 했고, ‘레옹’을 통해 처음으로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배우를 알게 되기도 했지요. 이런 우연한 발견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물리적 공간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비디오 가게는 추억의 저장소, 동시에 감정의 타임머신
1990년대 비디오 가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거기엔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연인이 함께 빌린 멜로 영화에 담긴 풋풋한 설렘, 아이들이 손뼉 치며 고른 만화영화에서 느껴지는 순수함, 혼자 찾은 독립영화 코너에서 마주친 외로움과 성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편리함은 오히려 감정의 밀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비디오 가게는 ‘불편함’ 속에서 감정을 더 깊게 새겨주었고, 선택의 무게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추억이 자꾸 1990년대로 회귀하는 이유도, 그 불편함 안에 숨겨진 ‘정서적 농도’ 때문 아닐까요?